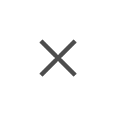한 해가 지날수록 어릴 시절 기억은 점점 흐려지지만, 그럼에도 잊히지 않는 것이 있다. 가령 이모를 따라갔던 동네 목욕탕에서 혼자 얌전히 기다리라고 쥐어주셨던 빨대 꽂은 밀키스, 비싸서 가끔씩만 먹을 수 있었던 월드콘과 초콜릿 꽁다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삼립 포켓몬스터 빵 속 띠부띠부 스티커, 아버지가 퇴근길에 포장해온 포장마차 닭꼬치 양념 냄새.
오늘 내가 기록하고자 하는 추억의 세계는 국내 맥주, 오비 카스와 진로 하이트다.
요즘 2030 사이에서 맥주라 하면 오비라거나 하이트보다는 바다 건너온 수입 맥주가 더 익숙할 것이다. 독일, 벨기에, 호주, 중국, 일본 등등 정말 다양하다. 편의점에만 가더라도 알록달록, 화려한 로고로 유혹하는 브랜드가 즐비하다. 그 가운데 한국 맥주 취급이란, 석연찮다. '물 탄 맛'이라 안 마신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만 꼽아도 트럭일지 모른다.
뭐, 어느정도 이해는 간다. 유럽에서 맥주의 입지를 논하자면, 와인 못지않을 테니까. 독일산 막걸리와 한국 막걸리 중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후자를 고르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도 가끔씩 마트 주류코너를 지나칠 때면, 수많은 캔맥주 사이에서 카스랑 하이트에 눈이 가기도 한다.
요즘이야, 온갖 수입 맥주가 편의점에 널렸고 맥주집에서도 외국 생맥주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지만, 아주 어렸을 적 나에게 맥주란 단 두 종류뿐이었다. 오비 라거, 그리고 하이트. 국내 맥주 브랜드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쟁쟁한 두 라이벌은 광고에서도 심심찮게 나왔다. 특히 오비 라거의 “랄라라~♪”하고 콧노래 흥얼거리며 손가락 춤을 추던 박중훈 배우가 아직도 기억날 정도다.

하이트는 나한테 아버지 전용 술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주말이면 내게 5000원을 쥐어 주고 심부름을 시켰다. 메뉴는 담배한 갑, 안주용 과자, 그리고 하이트 한 캔.(이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에 제재가 없었다) 남은 잔돈 중 오백원은 용돈이었다.
아마 이맘때쯤일 터다. 야구 경기로 관중 열기마저 느껴지는 텔레비전에선 아나운서가 목청을 올리고, 새우깡에선 고소한 새우 튀김 냄새가 풍겼다. 착-, 하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캔이 열리면 이어지듯 꿀꺽꿀꺽 목구멍을 넘어가던 소리가 맥동같았다. 이윽고 허리가 구부러진 맥주캔에선 알싸한 술 냄새. 퇴근하고 느지막하게 돌아온 아버지 양복에서 나던 냄새.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이트는 나한테 아버지의 시간을 불러일으키는 향수다.
그런가 하면 카스는 내 젊음의 첫 따옴표다. 막 수능 시험을 끝내고 뭘 해야할 지 아무것도 모르던 스무 살. 철들지 않은 나로선 그럴싸한 어른 흉내가 필요했다. 술도 약하면서 무슨 객기였는지 오티니 뒷풀이니 술자리는 좋다고 꼬박꼬박 드나들었다. 우중충한 조명, 촌스러운 옥색 테이블, 앉자마자 묻지도 않고 나오는 강냉이와 치킨무, 기름에 튀기는 통닭 냄새와 지나간 축구경기 재방송. 그리고 주문한 맥주 2000cc가 나왔다. 카스(CASS)라 쓰인 유리컵에 가득 따르면 당연하다듯 서로 건배를 했다. 알딸딸한 탄산에 괜히 캬아- 단 소리를 내면 내가 좀 더 어른이 된 것만 같던 찰나.
그런데 어느덧, 나 또한 아버지가 내 앞에 앉아 맥주를 홀짝거리던 나이에 접어들었다.

비록 흔해 빠진 술일지라도, 거쳐온 시간만큼 담긴 추억도 존재하는 듯 하다. 특히 세대를 거친 브랜드는 더더욱 지나간 시간을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레트로가 다시 유행하는 걸까.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더라도 소중하게 기억할 수는 있으니까.
특출나지 않지만, 그래서 익숙한 맛. 가끔은 화려한 맛이 아니라 덤덤하게 추억을 마시고 싶기 마련이다. 그 김에 그리운 과거를 안주처럼 머금어본다.
사진= 김태윤 기자








![[인터뷰] 힙지로 숨은 독립서점 ‘보위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44/2023112913221170392_1701231731.jpg)
![[인터뷰] 코카콜라가 ‘원더플 캠페인’을 지속하는 이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44/2023090514450264107_1693892702.jpg)